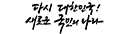제도 도입 배경과 의의
도입배경
-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통상현안으로 등장하였고, 1994년 UR타결에 따라 "세계 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이 다자간 협정으로 제정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협정은 식물품종을 특허법 또는 개별법 등으로 보호하도록 하여 품종보호제도는 WTO 가입국가의 의무사항입니다.
식물 신품종보호제도의 정의
- 품종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등록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에서는 식물의 특성상 특허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품종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서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의 식물 신품종보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식물 신품종보호제도의 의의
- 식물 신품종보호제도의 의의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 생산성의 증대와 농민소득을 증대하는 데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품종 개발에는 오랜 시간, 기술 및 노동력이 소요되며 많은 비용이 투입됩니다. 새로운 품종이 육성, 개발되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복제·재생산된다면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자의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기회가 박탈되어 개발의욕을 상실케 합니다. 따라서 품종보호제도는 육성자로 하여금 타인이 육성자의 허락 없이는 신품종의 상업화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그리하여 품종보호권을 가진 육성자가 개발비용을 회수하고 육종 투자로부터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합니다.